[정동칼럼]대립의 시대, 새로운 은유가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은유란 인류의 역사에서 생존의 필살기다.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와 언어철학자인 마크 존슨은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인간의 사고 과정이 은유적 개념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일찍이 강조했다. 레이코프는 미국의 전쟁서사에 은유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섬뜩한 현실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은 약자를 구원하는 영웅으로, 이슬람 국가는 악마화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역사와 정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은유적 표현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시간은 금이고, 타고난 부는 금수저로, 반대는 흙수저로, 모든 입시와 취업은 소위 전쟁이다.
한때 인류의 진화에 대한 과거 인류학자의 상상력도 은유적 개념에 근거했다. 미국 인류학자 루이스 모건은 <고대사회>에서 문화가 야만, 미개, 문명의 단선적 과정으로 진화한다고 상상했다. 여기엔 문화가 마치 동식물종처럼 생명체와 같다는 은유적 사유가 밑바탕이 된다. 즉, 원주민은 야만적인 유아적 단계로, 서구의 백인은 문명화된 성숙한 단계로 상상했다. 반면, 프랑스 과학기술학 연구자로 유명한 브뤼노 라투르 역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서구 근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은유적 사고, 즉 시간을 비가역적 화살, 자본화, 진보로 이해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시간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오직 진보를 향한 전진만이 있을 뿐 과거로의 퇴행은 상상불가인 셈이었다. 뒤처진 것은 손실과 실패로, 앞서간 것은 이득과 성공으로 받아들여왔다.
이렇듯 은유의 역할이란 개인과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의 생사를 결정하는 ‘프레임’(레이코프의 표현을 빌리자면)이다. 관련하여 식민지배와 은유를 기반으로 한 통치는 프란츠 파농(프랑스 정신과 의사, 알제리 독립운동가)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 잘 묘사되어 있다. 식민지 피지배국가(알제리)는 악마와 질병으로, 지배국가(프랑스)는 이를 저지하고 치유하는 존재로 비유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선과 악이라는 뚜렷한 이분법적 은유가 식민지 지배의 인스타 팔로워 구체적 수단이 되었다. 백인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선하고 부자였던 것이다. 반면, 원주민은 악의 본질이기에 반드시 윤리 의식이 없어야 하는 존재였다. 파농의 글 속에서 마치 조선과 일본의 식민통치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닐 게다.
파농은 이러한 식민지 통치의 은유에 원주민이 동화되면서 이들의 열등감이 뿌리 깊게 자리잡힐 것이며, 독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예견했다. 실제로 그는 제3세계 국가들이 유럽을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줄 ‘거인’처럼 대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 거인을 좇아 잃어버린 시간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간성과 이성을 파괴할 수 있는 리듬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식민 시절의 그 은유로부터 온전히 독립한 것일까. 중흥, 발전, 성장, 극복, 전환, 노선 등의 표현들이 통용되는 현실을 보자면, 파농의 우려가 가장 뚜렷하게 실현된 나라는 아닐는지. 만일 우리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국민이고, 바삐 앞서가는 거인을 좇아가지 못했다고 상상하고 있다면, 파농의 지적처럼 탈식민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인구 급감, 당신의 선택은?
헌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과 검사들
전환마을을 넘어 전환도시로
최근 영국 인류학자 팀 잉골드의 저서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가 번역되었다. 잉골드는 ‘선으로서의 삶’에 대한 철학-인류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은유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여기서 선은 화살과 같은 직선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 <춤>에서 5명이 댄서가 손과 손을 매듭처럼 잇고 만든 원 안의 선(in-between)을 뜻한다. 그리고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며 서로 매듭처럼 한순간이라도 연결되지 않는다면 급류에 휩쓸려 갈 것이라 말한다.
오늘날 한국이라는 바다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어떤 풍경일까. 직선일까, 혹은 매듭으로 이어진 원일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다수의 일상에 시기별 주제만 다를 뿐 여전히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 그에 따른 긴장과 불안이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직선적 은유가 압도하는 사회에는 앞선 사람과 뒤처진 사람, 옳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잉골드가 제시한 인류학적 사유는 단순한 은유의 전환이 아니다. 한국에선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배해온 극단적 이분법의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인류의 전쟁사를 통해 은유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경험했다면, 정녕 정반대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새로운 은유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와 악마로 낙인찍힌 천사가 구분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뒤엉킨 세상이지 않은가.
한때 인류의 진화에 대한 과거 인류학자의 상상력도 은유적 개념에 근거했다. 미국 인류학자 루이스 모건은 <고대사회>에서 문화가 야만, 미개, 문명의 단선적 과정으로 진화한다고 상상했다. 여기엔 문화가 마치 동식물종처럼 생명체와 같다는 은유적 사유가 밑바탕이 된다. 즉, 원주민은 야만적인 유아적 단계로, 서구의 백인은 문명화된 성숙한 단계로 상상했다. 반면, 프랑스 과학기술학 연구자로 유명한 브뤼노 라투르 역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서구 근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은유적 사고, 즉 시간을 비가역적 화살, 자본화, 진보로 이해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시간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오직 진보를 향한 전진만이 있을 뿐 과거로의 퇴행은 상상불가인 셈이었다. 뒤처진 것은 손실과 실패로, 앞서간 것은 이득과 성공으로 받아들여왔다.
이렇듯 은유의 역할이란 개인과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의 생사를 결정하는 ‘프레임’(레이코프의 표현을 빌리자면)이다. 관련하여 식민지배와 은유를 기반으로 한 통치는 프란츠 파농(프랑스 정신과 의사, 알제리 독립운동가)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 잘 묘사되어 있다. 식민지 피지배국가(알제리)는 악마와 질병으로, 지배국가(프랑스)는 이를 저지하고 치유하는 존재로 비유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선과 악이라는 뚜렷한 이분법적 은유가 식민지 지배의 인스타 팔로워 구체적 수단이 되었다. 백인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선하고 부자였던 것이다. 반면, 원주민은 악의 본질이기에 반드시 윤리 의식이 없어야 하는 존재였다. 파농의 글 속에서 마치 조선과 일본의 식민통치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닐 게다.
파농은 이러한 식민지 통치의 은유에 원주민이 동화되면서 이들의 열등감이 뿌리 깊게 자리잡힐 것이며, 독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예견했다. 실제로 그는 제3세계 국가들이 유럽을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줄 ‘거인’처럼 대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 거인을 좇아 잃어버린 시간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간성과 이성을 파괴할 수 있는 리듬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식민 시절의 그 은유로부터 온전히 독립한 것일까. 중흥, 발전, 성장, 극복, 전환, 노선 등의 표현들이 통용되는 현실을 보자면, 파농의 우려가 가장 뚜렷하게 실현된 나라는 아닐는지. 만일 우리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국민이고, 바삐 앞서가는 거인을 좇아가지 못했다고 상상하고 있다면, 파농의 지적처럼 탈식민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인구 급감, 당신의 선택은?
헌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과 검사들
전환마을을 넘어 전환도시로
최근 영국 인류학자 팀 잉골드의 저서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가 번역되었다. 잉골드는 ‘선으로서의 삶’에 대한 철학-인류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은유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여기서 선은 화살과 같은 직선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 <춤>에서 5명이 댄서가 손과 손을 매듭처럼 잇고 만든 원 안의 선(in-between)을 뜻한다. 그리고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며 서로 매듭처럼 한순간이라도 연결되지 않는다면 급류에 휩쓸려 갈 것이라 말한다.
오늘날 한국이라는 바다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어떤 풍경일까. 직선일까, 혹은 매듭으로 이어진 원일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다수의 일상에 시기별 주제만 다를 뿐 여전히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 그에 따른 긴장과 불안이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직선적 은유가 압도하는 사회에는 앞선 사람과 뒤처진 사람, 옳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잉골드가 제시한 인류학적 사유는 단순한 은유의 전환이 아니다. 한국에선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배해온 극단적 이분법의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인류의 전쟁사를 통해 은유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경험했다면, 정녕 정반대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새로운 은유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와 악마로 낙인찍힌 천사가 구분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뒤엉킨 세상이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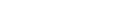



댓글목록